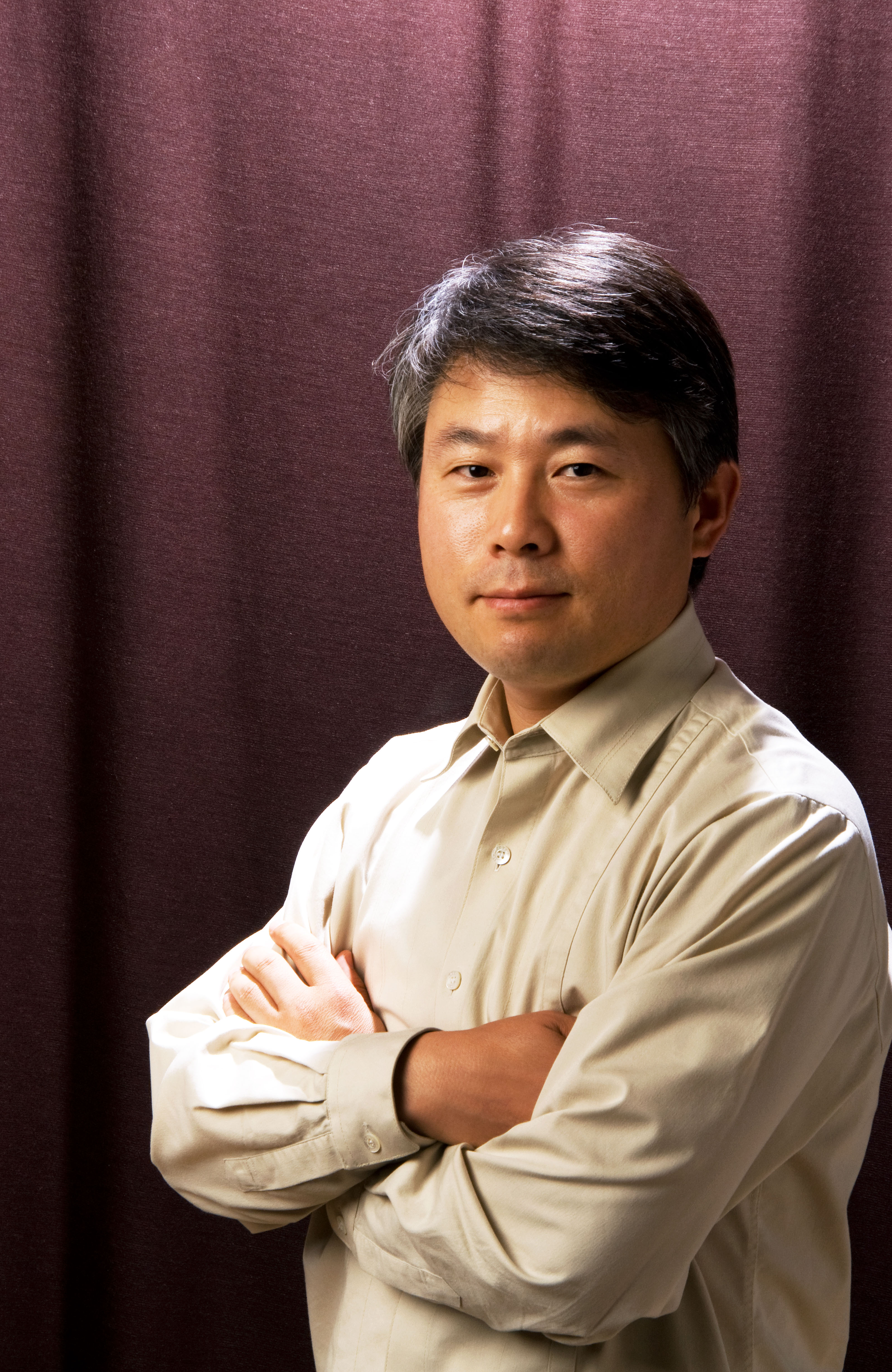
지난 12월 29일. 2년간 공들였던 집한 채가 완성되었다. 새로 지은 집이 아니라 고친집이다. 250명의 부랑인이 살기위한 은평의 마을 생활관.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시설이다. 1700명이 산다. 소년의집을 운영하는 (재)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지난 30년간 위탁 관리해 왔다. 그간 마을의 운영위원으로 참가했지만 건축가인 내가 실질적으로 도울 건 많지 않았다. 그저 자문하는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원장수녀님이 슬그머니 물으신다.
- 지금 사는 이집 고쳐 쓸 수 있나요?
- 물론 가능하죠.
- 그럼 이 집 고쳐 주세요! 그걸로 끝이다. 요청이 심플하다.
-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 지금 400명이 사는 집인데 원룸으로 바꿔주세요. 예산 받았어요.
- 그 돈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원룸스타일로 바꾸면 400명이 다 못사는데요.
- 그래요? 안되는데……. 그럼 예산 내에서 해주세요.
아기가 밥을 달라는 말처럼 간단하고 당연하게 요청하신다. 그래서 거부하기 어렵다. 내년연말에 들어와 살아야한다는 요청을 덧붙인다. 지하1층 지상 5층 1700평이 넘는 적지 않은 규모다. 구조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꾸어야 한다. 아무리 따져도 시간 예산 모두 부족하다. 머리가 아파진다. 어떻게 바꾸어야할지 정해진 내용도 없다. 거꾸로 수녀님에게 숙제를 낸다. 어떻게 쓸지.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오는 대답은 더 황감하다. ‘개략설계하고 공사하면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헉!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주저리주저리. 그러면서도 심플한 요청을 풀기위해선 몸을 풍덩 담그는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다. 오래전 청사진 도면이 있다. 30년이 넘었다. 현장과 맞을 리 없다. 다시 다 잰다. 설계를 위한 실질적 요청은 디자인이 완성될 즈음 하나씩 그리고 툭툭 나온다. 폭탄 급이다. 해법을 찾기 어려워 인상이 써지면 담백한 일갈이 날아온다.
- 바꾸는 거 복잡한 건가요? 그럼 안 해도 되구요...
더 심플하다. 안할 수 없다. 끙끙끙. 머리 터진다.
공사가 시작되자 혼자 힘으로 모자라 전기, 기계, 소방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 봉사하는 일에 끌어들이는 것이라 미안함이 앞선다. 몇 달이 지나 참여한 이들에게 요즘 어떠신가하고 물으니 ‘은평의 마을에 가는 일 말고는 즐거운 일이 없네요.’라고 답한다. 대가가 적고 봉사가 많은 일인데 즐겁다니 이해하기 힘든 노릇이다.
우리는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건축가는 물론 용역참여자 모두가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하기란 진정 쉽지 않다.) 그것은 건축에 대한 직원에 대한 직업에 대한 그리고 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건축가의 책무다. 디자인을 세심하게 한다거나 감리에 최선을 다한다거나 새로운 재료의 구축법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근원적이다. 그런데 이번 일에선 참여자 모두 대가의 많고 적음에 대해 말해본적이 없다. 신기한 일이다. 참여자 모두 금전적 대가보다 큰 ‘보람’ 이라는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하면서 ‘올레길을 낸 서명숙’과 ‘은평의 마을 수녀님’이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꼬이는 힘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꼬인 사람 모두 큰 보람을 느낀다는 점이다.
올레길이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고 나에겐 처가가 제주도라 더 익숙한 말이었으나 한번도 ‘올레길’이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우연히 접한 「꼬닥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에서 올레길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기획된 것이란 사실은 충격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그 사실이 깨달아진 다음엔 길의 아름다움보다 길을 만든 사람의 의지와 안목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지켜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보람이 보였다. 은평의 마을 일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은평의 마을을 만드는 수녀님과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보람. 나도 그중 하나이다. 건축가이기에 건축가의 몫을 했다. 기꺼이.
2년 동안 내가 한 것이 디자인적으로 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치 않다. 다만 나는 내가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되어 잘 쓰이고 있다는 점이 날 행복하게 한다. 그것이 또 다른 대가다. 누군가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해서 보람으로서 대가를 받는 일 그것도 건축하는 맛이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수녀님은 건축을 잘 몰랐던 게 아니다.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 프로젝트를 끌도록 만든 것이다. 이제야 깨닫는다. 수녀님은 고수중의 고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