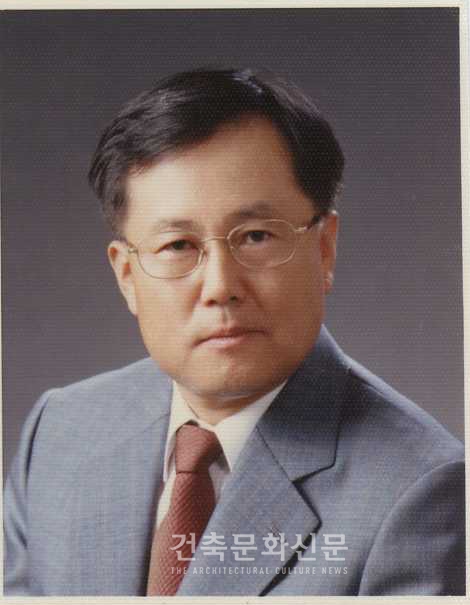
아주 어릴 적 피라미 떼와 같이 건너던 징검다리에서 축제와 같이 마을의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만들던, 큰 비오면 떠내려가 없던 외나무다리. 그리고 작은 자동차가 억지로 지나가고 소달구지나 리어카가 건너던 삼십 몇 년 전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철근 몇 가닥 넣고 만들었던 새마을 다리.
동구 밖 맑은 강에서의 다리에 관한 추억들이 너무나 많다. 황토물이 넘치고 길고 긴 장마가 시작되면 학교도 어쩔 수 없이 휴교하고 강가에서 흘러오는 나무토막을 줍던 삶의 끈과 같은 다리가 무너지고 난 뒤 새로운 최신형 교량이 건설되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건설한 그 멋진 다리가 아닌 교량이 왜 시골만 가면 내 마음을 답답하고 무겁게 하는지
200년 주기 홍수에도 끄떡 없이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우람하고 무척 크고 높은 난간 파이프가 알루미늄으로 번쩍이는 지난번 무너진 새마을 다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신 공법의 교량이 왜 내게는 아름답고 정겨운 다리가 아닐까.
새로운 교량은 동구 밖 느티나무의 높이를 반으로 낮추고 다리 위에서 마을을 굽어보고 어느 때부터는 교량이 주인으로 행세하는 경우로 바꾸어 버렸다. 직강공사도 중요하고 홍수 예방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간의 접근이 곤란하게 설계하고 시공한 몰 인간성 극치를 이루는 사업들. 새벽마다 걸어보는 강가 뚝방 길이 어느 샌가 황토 흙길은 자취도 없어지고 모든 길은 시멘트 포장도로로 변하여 돌멩이가 채이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물뱀이 길을 막아 가슴 철렁하게 하는 마지막 남은 강 건너 길도 어느 덧 몇 달 사이에 말끔히 포장된 새 길로 변하고 말았다.
하루 자동차 몇 대도 지나지 않는 길을 길 옆 찔레꽃도 칡넝쿨도 모두 베어내고 황량하고 햇볕 반짝이는 시멘트로 포장할 건 무엇이랴. 자연의 품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을 집행하고 설계를 졸속으로 하는 현대 행정에서 왜 우리 건축이 고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우리 앞집, 일가 친척집도 어느 날부터 낡은 헌 집을 철거하고 주변 나지막한 고만고만한 집들 복판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일층 바닥이 이웃집 처마높이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공룡의 건물이 농촌마을의 스카이라인을 일순간에 망쳐놓은 이 건물은 멀쩡하게 넓은 대지를 그냥 두고 동향으로 설계되어 현관문 입구에서는 낮은 우리 집 안방까지 훤하게 보이도록 건축되었음을 현장조건을 전혀 고려 할 줄 모르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생각 할 수 없이 단지 건축법만 맞추고 대문과 현관이 마주보면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미신에 따라 설계를 요구한 건축을 전혀 모르는 친척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고 건축주를 설득하고 좋은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건축사가 더 문제가 아닐까?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 경관이 제일 좋은 곳이 어느 때부터 국적 없는 건물들의 경연장이 되고 말았다. 무작정 건립되고 있는 펜션과 장어 집과 닭도리탕 집들이 어느 집은 붉은색 황토 흙에 이상한 기와지붕, 어느 집은 슬래브 집에 기막힌 외벽도색으로 또는 조립식 주택으로 이런 집들을 설계하고 건축한, 그리고 허가한 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모든 도시가 또는 대한민국이 서울과 같이 설계되고 건축되고 공간구성이 같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강원도 산골짜기와 해변과 혹은 전라도 강변은 모든 것에서 경관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현지의 건축 재료나 주변지역의 색상들, 토속적인 지방의 문화,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건축 공간 환경이 구성 될 수 있는 노력들이 이제는 필요한 때이다.
돌멩이가 체이고 비오면 웅덩이가 생기는, 그래도 새벽이면 풀잎 이슬을 밟고 온갖 벌레들과 찔레순도 따 먹고 진달래, 들국화가 어울리는 길이 더 정겹고 아름다운 길이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징검다리, 외나무다리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박 넝쿨이 지붕에 오르지 못하고 저녁연기 오르는 굴뚝들은 없어져도 삶의 근원인 시골들은 앞으로도 계속 시골다웠으면 하고 바래본다.
비오면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온갖 벌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시골의 비포장 작은 길들과 아름다운 마을들이 잘 보존되고 우리들의 정서와 정체성에 부합되게 개량되는 살아있는 계획들과 노력들이 인간중심의 도시와 건축에 접목될 수 있으면, 우리 국토의 품격향상은 물론 산과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고 문화민족의 긍지로서 맑고 밝은 정서가 묻어나는 것들에 우리 건축인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