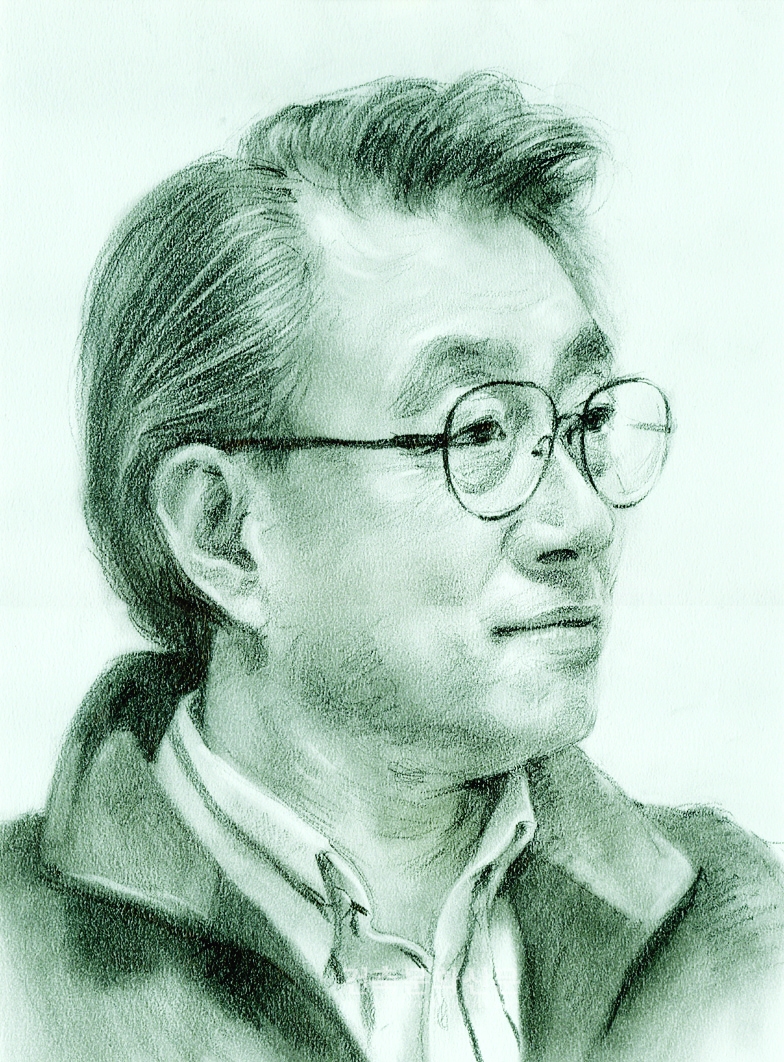
항상 건축사들에게는 ‘현상설계’라는 숙명적 굴레를 가지고 있다. 확실한 스폰서나 배경이 없는 한 건축가들은 현상설계야 말로 유일한 출세통로가 되며, 명실 공히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인다.
현상설계의 개념은 관계자들 마다 그 정의와 방법, 해석을 각기 다르게 판단하는바 필자도 나름대로의 40년 경험을 바탕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피력코자 한다.
개념
현상설계는 무엇인가? 건축주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여러 의견 중에서 고르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일부 관 조직에서는 회계규정상 감사를 의식해서 하는 측면도 있으나 그 방법과 방향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므로 Design 아이디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턴키나, BTL, 계획설계개념의 현상 등 기술적 중요도나 완성도, 예산 등 여러 형태의 조건에 따라 구분 될 수 있다. 어쨌든 현상설계의 제일 중요한 기본은 “건축주의 원하는 바를 도출”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Idea수준이든 턴키수준이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이다.
따라서 건축주는 자기 의사를 아주 명확히 해야 하는데 항상 이것이 문제다.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만 제대로 지키면 별 탈 없는데, 흐리멍텅하게 하는 경우, 현상설계 때의 작품과 공사후의 물건이 전혀 다른 것이 되기 쉽다. 그래서는 현상설계의 의미가 없다. 잡음만 있을 뿐이다.
공개
우선 건축주는 원하는 건물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 집단을 추출해야한다. 비교적 공신력이 좋다는 대학교수를 포함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를 추출한 후 그 전문가들 중에서 미리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 심사위원에게로부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 심사위원을 선정 시 최소한 응모자 수준의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저 좋은 것을 뽑아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 심사위원의 분명한 심사방향을 사전에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고 건축주는 그 심사방향이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응모자들은 심사위원들의 심사방향을 미리 알고 그 방향에 맞추어 작품을 낼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건축주의 목표와 일치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심사위원의 비밀은 잘 지켜지기 어렵다. 규모가 큰 경우 바로 전날이나 새벽에 연락하여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쟁하는 응모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명단을 알아내려하며 응모자가 큰 조직이라면, 그 조직 구성원의 연고를 따져 후보군의 심사위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면서 까지 접촉하려 한다. 위법이 아닌 한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처방은 어렵다고 본다. 미리 심사위원을 공개하여 분명한 심사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응모토록 하고 심사위원은 본인의 판단에 대하여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 사회에서 경쟁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게임은 공정해야하고 룰은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
계량화
심사는 다분히 주관적 판단에 기초를 둔다. 그러나 이는 감성적 요인이 많으므로 반드시 계량화한 점수로 판단토록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며, 이미 시행하는 예도 있다고 본다.
설계비
현상설계는 최저 입찰의 개념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반드시 설계비를 건축 전문기관(건축사협회 등)으로부터 등급 결정은 받아 미리 공개한다. 일정한 수준 이상이 아니면 건축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경쟁하는 현상 설계에서 당선자 이외의 낙선작품이 공짜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복수 당선으로 할 수도 있고 낙선자에게 응분의 보수도 필요하다. 그래서 현상설계는 수의계약보다 경비가 더 든다는 것을 건축주는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에게 가장 괴로운 것 중의 하나는 수정이다. 불가피 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기껏 잘 뽑아 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전혀 다른 것으로 된다면 건축주의 준비 부족이며 이를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 한 건축사의 불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