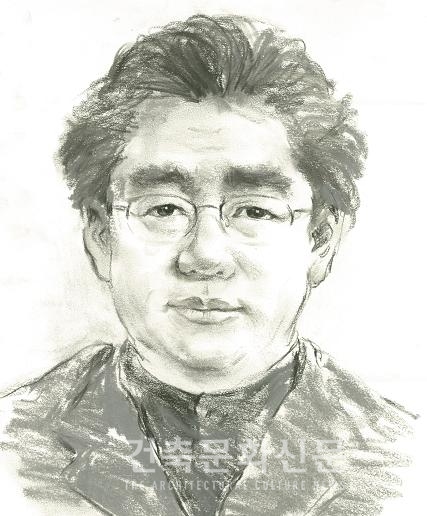
우리의 존재는 하늘의 씨앗이다. 그 안에는 이미 ‘씨알’로 발아(發芽)되어야 할 이파리와 꽃과 열매가 그득 들어있다. 오늘의 우리에게 오기까지 몇 억겁(億劫)인지 알 수 없는 생명의 긴 행렬과 또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생명의 열매가 담겨져 있다. 이 ‘씨알’은 그 스스로 안에 이미 하늘의 명령을 받은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력은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주 의 뜻에 따라 성장하도록 되어있다.
이 생명의 자생력을 막는 장애물이 오늘의 건축물과 도시의 환경이다. 이 생명들이 도시의 척박한 뜨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이 땅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품종화하여 배양하고 대량생산을 위한 개발에 자투리시간들을 투자한 결과 지금은 200여 과(속)식물들을 모아 약500여 분경작품으로 가꾸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한라에서 백두대간에 이르러 현화식물, 귀화식물, 원예식물을 합하여 약 3,700여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개화기는 4~8월에 가장 많은 꽃들을 관상 할 수 있으나 배양기술과 환경에 따라 사계절, 다양한 꽃들을 감상 할 수 있다. 꽃들의 색상은 황색계열의 식물이 33%, 흰색계열 28%, 청색계열 26%, 적색계열의 꽃이 13%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꽃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의 꽃말들을 배우고 익혀야할 어린이들에게는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외래의 꽃들이 행사장을 뒤덮고 있다. 목적이 이끄는 전시회에 한국야생화연구회에서는 200~800여 분경의 작품을 출품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와 찬사를 받아왔다.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양분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한국야생화로 일깨워진 동심들은 자생지, 개화기, 분경가꾸기, 물주는 방법 등 규격화된 건축공간속에서도 배양이 가능 하는지 묻고 또 묻는 긴 행렬의 발열량으로 여린 식물들은 지쳐 상하기도 한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도시와 건축은 그 땅에서 자생하던 산야초를 다시 그곳에 복원하는 일이다. 자연을 다시 건축과 도시로 이입하는 것이다. 초본류 식물로는 기린초, 구절초, 화려함을 자랑하는 금낭화, 상사화로 이름난 꽃무릇, 차의 용도 둥굴레, 식용의 동의나물, 우산나물, 백두에서 내려온 매발톱, 물을 좋아하는 돌단풍, 창포, 붓꽃, 가장 세계적인 나리과식물의 땅나리, 하늘나리, 솔나리, 말나리, 원추리, 조경용으로 군집하여 심는 털머위, 자란, 초롱꽃, 이른 봄의 전령사 복수초와 할미꽃, 늦가을까지 꽃이 피는 해국 등, 그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넘친다. 넝쿨성 식물로는 능소화, 마삭줄, 송악, 인동초, 줄사철, 담쟁이, 등나무 등 건물의 입면과 옥상 그리고 도시의 옹벽을 덮어 사계절마다 이파리가 나고 꽃이피고 열매가 맺고 단풍으로 물들은 도시의 얼굴은 지속적인 녹색성장 친환경적으로 바꾸어질 것이며 생산되는 맑은 산소는 도시인들의 지친건강을 담보해 줄 것이다.
“신은 자연을 창조하였고 인간은 도시를 창조 한다.” 윌리엄 쿠퍼(William Cowper, 1731-1800)가 주장하는 도시의 창조는「時·空·物」창조 이 후의 피조물들을 조합하는 재창조의 뜻을 담고 있다. 창조주는 바닷물이 육지를 넘보지 못하도록 바닷가에 모래를 두었고 인간이 자연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땅에 자생하는 수많은 식물들을 두었다. 도시의 창조로 인간이 자연의 창조질서를 넘보게 된다면 이는 곧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는 큰 화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늦은 밤 삼․사경까지 분경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자의 한마디는 그 깐깐한 성깔 다 어디에 묻어두고 야생화에 미쳐 애첩 다루는 듯 하는 꼴이 너무나도 신기하단다. 그렇다, 나는 날마다 애첩들과 같은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며, 살을 맞대고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애첩이 500이나 되니 노후의 생활이 무척이나 행복할 것 같다.
신이 주시는 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믿음으로 주신 선물 앞에서 겸손할 뿐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