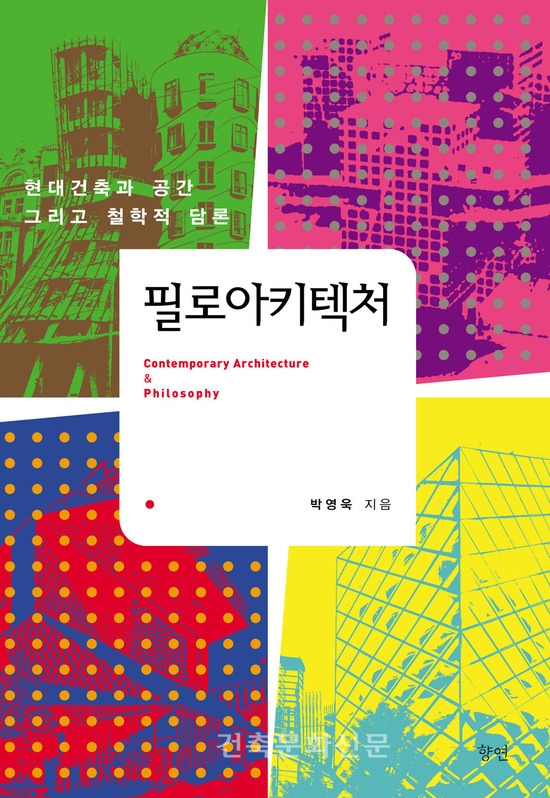
담론의 과잉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박영욱’이라는 철학자인데 그는 건축을 걱정하고 건축계 담론의 과잉을 걱정하며 책을 한 권 냈다. 80년대 중후반, 세상을 저울로 재어서 균일하게 갈라놓으려고 했던 계량주의적 모더니스트들의 시대가 지난 지 한참이고 냉전의 기류가 풀리며 세상이 바야흐로 속물화 되어가던 시절부터 비롯된 이야기이다.
이 책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와 해체주의 건축의 시대 이후 건축계의 전면에 듬뿍 뿌려 버무려진 철학적 담론에 대한 국외자의 쿨 한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필로 아키텍처’라는 책인데 한글 제목 밑에 조그맣게 쓰여 있는 영문 제목이 가리키는 대로 현대건축과 철학에 대한 다섯개의 이야기이다. 내용은 현대건축, 대부분 우리의 건축이 아니라 세계의 건축 혹은 해외의 주류건축이 기대고 있는 철학의 어깨가 얼마나 허구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근대건축의 시각중심주의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메를리퐁티의 공간론과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인 공간에 대해 규정하고, 베르나르 츄미와 장 누벨 건축의 한계를 고찰하고,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건축까지 시선을 확장한다.
그는 해체주의 이후의 건축에는 기능성 혹은 형식적 합리성 대신 담론이 끼어들게 되어 건축을 철학적 담론의 또 다른 실천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빚고 결국 건축이라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추상화시켜버렸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담론의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 결국 "근대의 건축이 기능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과 유리된 공간만을 생산하였다면, 해체주의 이후의 건축은 미학이나 철학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일상적 생활과 유리된 공간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정확하게 현대건축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물론 시원하면서도 아픈 이야기들이다.
다만 내내 편치 않은 것은 그 건축 담론들이 모두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대부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이론이라는 점일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곳, 한국의 건축계에서는 21세기 들어 이렇다 할 건축의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