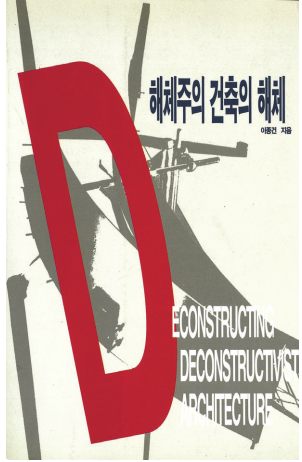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 / 이종건 저 / 발언
필자보다 윗세대라면 ‘포스트모더니즘’이었을 테고, 필자의 세대에서는 ‘해체주의’가 득세하던 시대였다. 그 시절 매체도 제한적이었지만, 일방적으로 수입된 건축이론은 매번 왜곡과 오독을 동반하며 그마저도 수용방식은 개량되기보다는 피상적인 아류작을 낳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의 저자는 그런 점을 비판하면서 이 책의 명분을 머리말에서부터 도발적으로 서술한다. 책을 읽을 여력이 없는 건축사들을 위해서 제발 이 책(!)이라도 읽고 세계건축 흐름에 역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해체주의 건축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파하진 못하더라도 공부하려는 건축사들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제공한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의 의의가 있다.
해체주의 건축은 3가지의 관점이 겹쳐있다(59p). ①문학해석의 한 방식을 기술하기 위한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기반한 것과 ②1920년대의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에서 부상한 것, ③마지막으로 피터 아이젠만을 위시하는 건축의 탈인본주의(또는 탈기능주의)적 관점이 그것이다.
이 셋은 해체주의 건축의 배경에는 필수적이지만, 태생과 사고체계가 다르기에 구분해서 이해해야 오독을 피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비교적 쉽게 서술되어 예전에 해체주의를 포기(?)했던 건축사라면 조각난 지식과 정보가 다시 연결되는 지적 희열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저자 이종건 교수는 현상학 기반의 존재론을 견지하는, 해체주의와는 반대측(!)의 건축학자이다. 그래서 저자는 해체주의 건축에 대해 비판을 넘어 ‘해체’까지 시도한다. 저자의 경도된 일방적인 글쓰기임을 참작하더라도, 해체주의에 대해 편파성과 오독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독자로서 저자의 입장이든, 저자에 반대하는 입장이든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이 반감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읽는 것보다 어느 한 편(?)을 정하고 이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비유하자면 야구경기를 볼 때, 소소한 명분이라도 내세워 좋아하는 팀을 선정하고 보면 훨씬 즐거운 것처럼 말이다.
저자는 해체주의 건축을 비판하면서도 책의 중간마다 건축사 김헌의 작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점이 앞서 언급한 저자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점이다. 그의 작품들이 해체주의 건축이론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저자는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해체주의 건축 논리에 가장 근접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 책으로 얻은 해체주의 지식을 토대로 그의 작품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 책으로 얻은 안목을 검증해 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
책의 보론으로 저자의 유학 시절의 텀페이퍼(학기말 소논문)가 실려있다. 견고해 보이기만 하는 데리다의 철학에 대해 지적으로 대결해 보려는 저자의 당찬 포부와 함께, 박사과정시절의 학문적 수준을 감히(!) 갈음할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책을 읽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해체주의 이후, 지금 우리 시대에서 세계건축흐름을 주도하는 건축이론은 무엇일까라는 생각과 우리는 매번 서구의 것을 수용만 하고 새로운 건축이론과 담론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