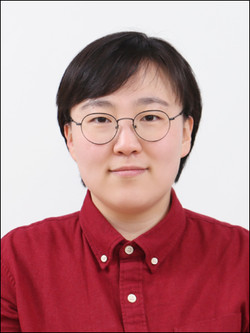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2750년경 소멸한다.”
옥스퍼드대학교 인구학 명예교수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 현상은 초저출산, 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아주 거대한 담론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인구 감소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대조적이다. 한국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2019년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당연하게도 지역에도 영향을 준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지역 소멸이란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심화돼, 지역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경제적 기능이 약화돼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가 처한 심각한 인구 변화는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역 및 국가 전체의 산업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서로에 영향을 주며 악순환을 이어간다. 한국의 소멸에 앞서 지역이 먼저 소멸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대로라면 30년 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세 군데만 남을 것이라 경고한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국가적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매년 증가하는 빈집, 병원과 같은 공공 인프라의 붕괴, 건축 수요 감소와 사업체 및 인력까지 줄어들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폐업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일 것이다.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어쩌면 줄어드는 인력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일 될지도 모른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줄어드는 인구와 사라지는 도시다.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축물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봐도, 그 공간을 사용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때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 고령의 인구만 남은 소멸하는 도시에는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