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기본계획, 1966년 이후 총 10차례 수립
2015∼2024년 모니터링으로 적시성 제고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연평균 8.8% 증가
신축 허가 연면적 5년간 62.2% 감소
서울 외 광역권 모니터링 부재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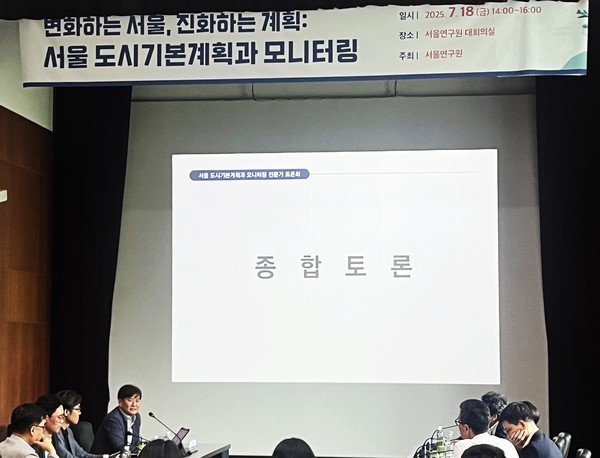
서울연구원은 ‘변화하는 서울, 진화하는 계획 :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의 과제’를 주제로 7월 18일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도시기본계획 60년의 역사와 2024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인희 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회고와 전망’,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장의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2024년)’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희 전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시대적 배경과 변천 과정을 짚었다. 1966년 이후 총 10차례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급격한 도시 변화와 성장을 이끈 핵심 도구로 평가된다. 그는 각 시기의 계획 수립 배경과 방향, 구성 방식, 시민 참여, 모니터링 체계의 변화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역 거버넌스’ 강화와 자치구 단위의 ‘생활권 계획’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2024년)’를 주제로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장이 맡았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서울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맹 실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연면적이 전체의 29.6%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8.8%씩 증가하는 등 건축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라며 “반면, 같은 기간 신축 허가 연면적은 62.2% 감소해 공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탈서울 현상 완화 ▲순차적 인생 모형 변화 ▲오피스텔 26만 호 시대 ▲서울경제 재구조화 ▲중심지 하이브리드화 ▲강화된 서울의 광역생활권 등 아홉 가지 주요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기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중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장경철 도시디자인공장 대표 등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김준형 교수는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이 당면한 이슈 중심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보다 직접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주거비 문제를 주요 이슈로 설정했다면, 과거 자료가 아닌 해당 이슈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연구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비해 서울 외 지역은 아직 데이터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뿐 아니라 인접한 광역권까지 함께 모니터링하고 연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서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디를 중심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하부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하부계획에서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와 같은 이슈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연계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철 도시디자인공장 대표는 “시민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현행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자치구의 근린생활권계획과 연계돼 생활과 밀접한 계획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성기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이 정례화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며 “도시공간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작동하는 만큼 영향권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