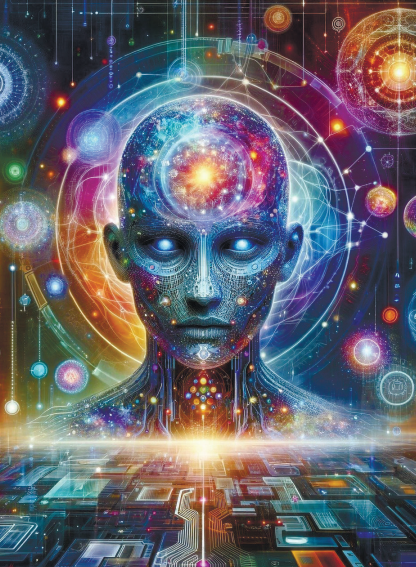
최근 한 기업의 관리자들과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대화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주제가 있었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었다. 업무 현장에서 AI 활용도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느꼈던 놀라운 경험들과 인간 역할 축소에 우려나 불안 등이 대화의 주를 이뤘다.
최근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일반적 기대감에 경종을 울렸다. 중국 저장대 연구팀이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생성형 AI와 협업한 후 직원들의 내재적 동기는 평균 11% 낮아졌고 지루함은 20% 높아졌다.
AI 활용으로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일에 몰입하는 경험’은 빼앗긴 셈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AI가 가져온 효율성 향상 효과가 상쇄할 수도 있다. 인간 근로자의 동기부여 수준이 낮아지면 창의성 등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쟁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는 자율성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다. 심리학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사람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일에 몰입하면서 성장한다. 인간이 해왔던 일의 대부분을 AI가 대신해주면 자율성이나 유능감 등을 느끼기 힘들다. 또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기회도 사라진다.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인간의 동기부여 요인 중 결정적인 것들을 잃게 되고 기업 조직은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AI와 인간의 역할을 잘 정립해야 한다. 즉, 자료조사나 초안 작성 등은 AI에게 넘겨도 되지만 창의성과 전략,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케터라면 자료조사와 키워드 분석, 초안 작성은 AI에게 맡기더라도 콘텐츠 전략 결정, 다른 메시지와의 일관성 조율, 최종 시안 결정은 인간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나 메시지의 작성자로 인간 필자의 이름을 명시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접근이다. 또 고객 응대 현장에서는 AI가 FAQ 응답을 처리하고, 복잡한 감정 응대는 사람이 맡아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동시에 잡도록 유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기계에게는 ‘하드워크’를, 인간에게는 ‘스마트워크’를 맡기는 셈이다.
또 AI를 활용해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해 일을 줄여주는 대신,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업을 인간에게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AI 역할이 큰 업무에 직원의 일부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면, 이들에 대해 순환 근무를 통해 인간이 주도하는 영역도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필요도 있다.
AI가 인간의 영역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 또 AI 기술을 배척해서도 안 되고 맹신해서도 안 된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던 일을 AI에게 맡기고 몰입과 성장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는 현명한 직무 설계를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