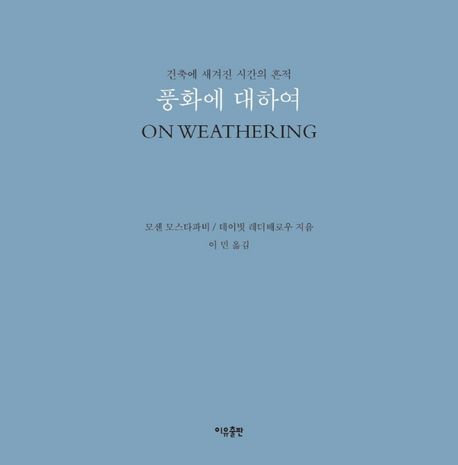
풍화에 대하여 / 모센 모스타파비, 데이빗 레더배로우 저 / 이민 역 / 이유출판
오독하기 쉬운 책이다. 결론은 쉽고 간결하다. 건축물은 완공된 이후에 소멸(!)을 전제로 자연의 셈법(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마이너스의 힘’)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건축역사와 이론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로 하고, 저자가 안내하는 정교한 논리를 잘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결론이 갖는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
책의 구성은 아티클 정도의 작은 분량이고 별도의 목차구성 없이 하나의 장(chapter)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 중간마다 ‘풍화’라는 뉘앙스에 적합한 서정적인 사진들이 삽입되어 있지만, 글의 내용은 분석적이고 해박하다. 필자는 후반부를 집중해서 읽기를 권한다.
르 코르뷔지에 초기작품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흰 벽’은 근대 이전으로부터 근대건축을 구분하는 표상일 뿐만 아니라, ‘미의 X선’이라 불릴 정도로 투명성과 순수성을 상징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자산(재료)이다. 모든 지역과 장소를 정화하는 이러한 흰 벽에게 있어 ‘풍화작용’은 작가의 의도를 훼손하고 비윤리인 것으로까지 여기게 된다.
이러한 경향과는 다르게 미국에서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에로 사리넨은 오브제로서의 건축물이 아닌 그곳에서 ‘자라나고’ 그곳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로 구현했다. 이들은 재료의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하였는데, 이를 흔히 ‘유기적 건축’의 특성이라고 설명한다(118p). 르 코르뷔지에도 1930년경부터는 순수성을 선호하는 태도와 다르게 브레이즈 솔레이유와 노출콘크리트를 고안하면서 지역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선회하였다. 필자에게는 이탈리아의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의 건축물이 이 책의 결론에 가장 적합한 사례처럼 보인다.
르 코르뷔지에처럼 지역적 기후에 맞춰 새로운 건축기법을 고안한 것과는 다르게, 스카르파는 밋밋한 외벽을 풍화작용을 극적으로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것이다(108p).
예상컨대, 저자가 말하는 결론에 대해 반대하는 오늘날의 건축사는 없을 것이다. 1996년 출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시시할 정도의 흔한 명제이며 오히려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면, 그 결론이 갖는 의미와 파급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건축사들이 건축 매체에 업로드하고 생산하는 이미지들은 어떠한 방해 요소 없는 완제품 같은 오브제와 모델하우스 같은 사진들을 선호한다. 때론 완공된 건물보다도 보여주기를 위한 사진에 대해 더 고민하며 연출하기도 한다.
예술은 작가의 작업이 완료된 완성품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갖고 보존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의 결론을 연장하면, 건축을 예술작품처럼 여기고 오브제를 추구해 온 근대건축을 비판하는 동시에 건축과 예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결국 저자는 상식적인 결론으로 건축의 위상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긴장해서 읽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원저의 ‘weathering’을 ‘풍화(風化)’로 번역한 것은 아주 적절해 보인다. 한편 책에서 말하는 풍화작용을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의미하는 ‘건축물의 생애주기’로 이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