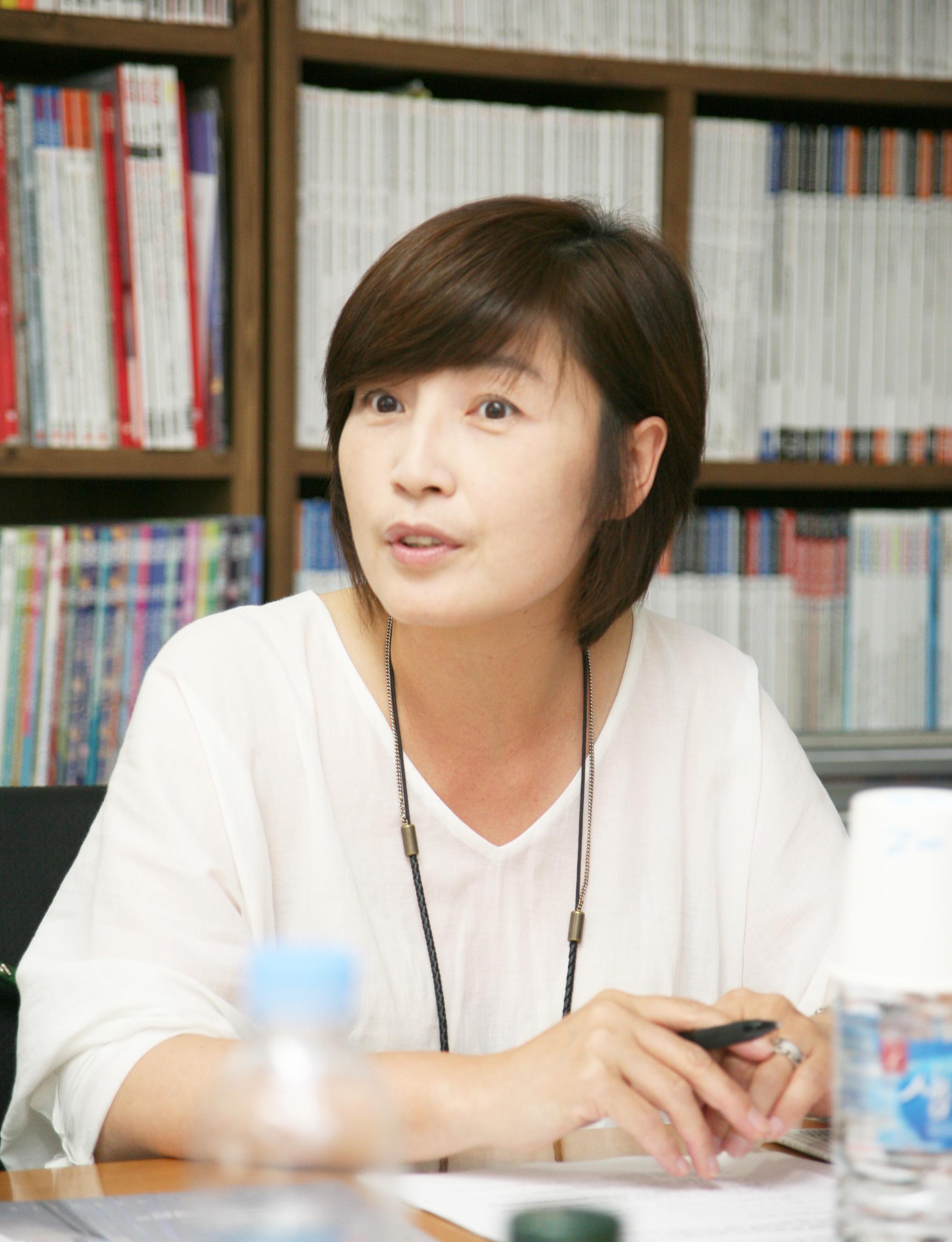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진행됐다.
우연히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을 통해 건축과 영화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어울림에 끌려 제1회 서울건축영화제를 찾게 되었고 그런 계기로 3회부터 영화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건축사 업무를 통해 수 없이 만나는 건축주와 다양한 디자인 관련 협력자 그리고 실무 조력자들까지 그 어떤 만남이며 상황들이 이야기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던 내게 영화와 건축의 만남은 그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의 실마리를 잡은 것과 같았다.
영화가 갖고 있는 감성의 전달 고리가 ‘건축’이라는 다소 건조해 보이는 작업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매개체로 그 역할을 훌륭히 해 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또한 삶을 바탕으로 하는 건축물의 역할을 영화가 가진 대중적 시각 코드를 통해 건축의 담론을 사회에 전달하고 건축계는 물론 영화계와 문화 전반의 콘텐츠까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축으로 건축이 재조명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영화제를 찾았던 관객이 “건축영화라는 것이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을까?”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난 후 건축물도 건축사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며 내가 내민 명함에 ‘건축사’라는 타이틀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인다.
1회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영화제를 찾는다는 또 다른 관객은 이미 건축사의 열혈 팬이라 말한다. 영화제가 갈 방향을 찾아주는 이런 관객들과의 소통이 서울국제건축영화제만의 자랑이다.
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관객과의 대화(GV)에서는 많은 부분 이런 소통의 맥락이 찾아졌다. 특히 기억되는 것은 영화 ‘로스트리버’ 상영 후, 진행되었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었다.
당초 필자와 김정인 교수(숭실대)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나, 당시 객석에 계신 청계천 복원에 자문을 하셨고 영화에도 출연하신 두 분(황기연 홍익대 교수, 노수홍 연세대 교수)을 모시고 갑작스럽게 진행했던 대화의 시간이었다.
건축과 환경 그리고 역사라는 시간대의 관계를 여과 없이 진솔하게 풀어내는 대화에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한 관객이 질문을 했다.
“건축을 잘 모르지만, 언제는 청계천을 복개하여 산업을 논하고, 왜 지금에 와서는 복개된 하천을 열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이미 관객이 영화를 통해 도시와 건축을 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도 나는 건축물을 단순한 물성으로 인지하는 한 건축주와 실랑이 준비를 하고 있다.
건축을 논하는 지금의 내 일터가 영화에서 담아냈던 삶이라면 이 둘은 다른 듯 참 많이도 닮지 않았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