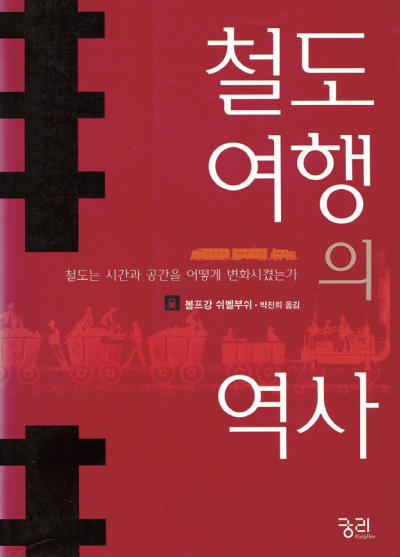
철도여행의 역사 / 볼프강 쉬벨부쉬 저 / 박진희 역 / 궁리
어느덧 고속철도가 일상화되었으며, 기차여행을 낭만적인 교통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18세기 말 이후 철도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수용과정에는 복잡한 갈등의 역사가 있다. 「철도여행의 역사」는 당시 철도라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갖는 특수성이 19세기 이후 시간과 공간개념이 변화되었음을 추적한 책이다.
19세기 철도기술과 여행의 대중화가 근대건축 발생의 배경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여행으로 인한 문호개방이 아니라, 철도여행으로 인한 ‘지각의 변화’이다. 초기의 철도는 석탄같은 물류를 운송하는 교통수단이었지만, 19세기에 들어서는 물류보다는 여객운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자는 마차가 담당하던 교통수단이 철도로 대체되면서 과거의 ‘경험’이 상실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마차를 타면서 보게 되는 경관(또는 풍경)은 3배 빠른 속도(당시 시속 40㎞ 수준)로 유리창 넘어 ‘파노라마’로 치환되고, 노면의 상태가 몸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마차의 움직임은 철도레일로 균질화되어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38p).
200년이 지난 현대인의 감각으로 바꿔말하면, 현재의 고속철도에서 보이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2시간짜리 연결된 이미지이며 여행이 아니라 이동이다. 그러나 당대의 평가보다도 저자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소멸하지 않고, 약화되거나 오히려 변화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역설적인 점은, 철도여행으로 ‘풍경’을 잃었지만 ‘독서’를 얻었다는 점이다. 유럽식 열차의 객실형(차량이 독립된 객실로 나뉘어 있는 형식)구조가 여행자에게 개인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담소보다는 독서가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사실 유럽열차 특유의 객실형 구조는 귀족의 마차의 객실을 원형으로 뿌리 깊은 계급문화의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등급화되고 고급화된 객실에서 독서가 여행문화로 자리잡게 되고 차츰 기차역에는 서점과 신문가판대가 입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기차역이 도시의 현관(Gate)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근지역의 상업공간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파리 최초의 백화점의 발생과 위치가 기차역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지금의 필자에게 와닿은 부분은, 철도여행과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정에서의 신·구 행동양식과 심리학적 증상을 설명한 부분이다. 철도여행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무의식적인 신뢰가 생기기까지 반세기의 세월이 필요로 하며, 저자는 그 과정의 여러 사건·사고들을 거쳐 적합한 행동양식이 형성되고 그전까지 설명하기 힘들었던 정신병리학 증상과 현상들이 있었음을 고찰한다.
필자에게 20세기 후반은 기계식 장치와 전자식(digital) 장치를 구분하던 시기였고, 21세기는 오히려 ‘직관적’이라는 이유로 기계식 방식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지금껏 필자가 생각한 직관 또는 감각이라는 것은 반복된 경험과 자극을 통해 변화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유하자면 필자의 세대는 시속 100㎞까지 경관을 인지할 수 있지만, 필자의 후세대들은 시속 300㎞까지 경관을 풍경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