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초, 나고 자란 지역 인근에 건축사사무소를 열었다. 수주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매번 의문이 들었다. 지금 여기에 만든다면 무엇을 만들까? 그에 관한 지금까지의 나의 짧은 경험과 생각들에 관해 적어보고자 한다.
경험#1
나는 무궁화 열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천천히 달리는 무궁화 열차는 우리나라의 산과 강, 도시와 마을 구석구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열차 안 창밖 풍경은 금세 변해갔다. 불과 몇 년 만에 많은 신도시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층아파트, 대규모 공공·상업시설들이 이제는 소도시, 작은 시골마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마치 전 국토의 도시화·중앙화가 되어가는 것 같은, 획일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다.
지역건축의 다양성
한국은 주변국들에 비해 작은 나라다. 하지만 산이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마다의 자연적, 물리적 환경이 달라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지역적 차이는 저곳과는 분명히 다른 이곳만의 건축을 형성해 나아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도시는 도시답게 마을은 마을답게, 우리 지역건축의 출처를 대도시나 해외건축사례에서 구할 게 아니라,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작업하고 있다.
경험#2
201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슬람국제대학교에서 열린 아카시아 건축학생 잼버리(ARCASIA STUDENT JAMBOREE)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2년마다 아시아 50여 개 국의 건축전공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와 건축에 관해 소통하는 행사였다. 그곳에서 알게 된 이웃나라 친구들은 페이스북, SNS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면서도, 한편으로 라마단 기간이라며 차도르를 두르고 일출에서 일몰까지 금식하고 기도를 드렸다. 참으로 신기하고도 낯선 광경이었다. 그들은 서구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 자기 나라만의 문화, 종교, 격식, 의복 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세계적이면서도 그들만의 특성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축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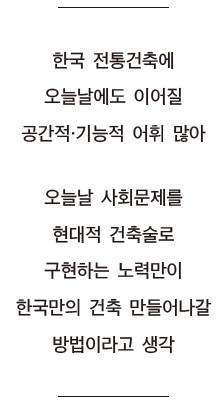
세계적이면서도 한국만의 특성을 갖는 건축
한국은 20세기 근대화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전통성의 계승과 지역성 상실의 문제이다. 한국 전통건축에는 분명 오늘날에도 이어질 수 있는 공간적·기능적 어휘들이 많이 있다. 지붕과 처마, 채와 마당, 건물과 담장, 시퀀스, 오브제가 아닌 관계성의 공간구성 방식 등 그것들을 통해 오늘날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현대적 건축술로 구현하는 노력만이 세계적이면서도 한국만의 특성을 자아내는 건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경은 사라졌지만, 곳곳의 장소가 이전보다 강한 개성을 발휘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 건축일을 하고 있다’는 한 아키텍트의 말이 머릿속 깊이 남아있다. 나는 우리의 도시와 건축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