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소규모 집합주거는 영세한 건축사무소에게는 아주 소중한 주제다. 업자가 선점했던 다가구, 다세대 주택 시장을 건축사가 되찾아 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천착하는지도 모르겠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법도 책임 있고 윤리적이어야 하는 건축사의 자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견이 있겠으나, 개인적 소견이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에 ‘방화창’ 설치 관련한 건축법 때문에 요즘 더 많이 속상하다. 법 규정으로 받은 인상은 철저하게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재 발생 시 인접 건물로 불이 옮겨붙는 이유로 주요 규제 대상이 도시의 소규모 건축물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화재의 결과만 놓고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한 무식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통계 상 주택 화재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주요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크다. 담배나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주요 화재 원인이라고 보면 화재의 원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법 제·개정이 우선이라고 본다. 보통 주방에서 가스로 조리하게 되면 상부에 확산소화기 설치가 의무지만, 외관상 좋지 않아 떼버리는 경우가 많다. 주택 내부라 규제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가스 사용을 규제하고 인덕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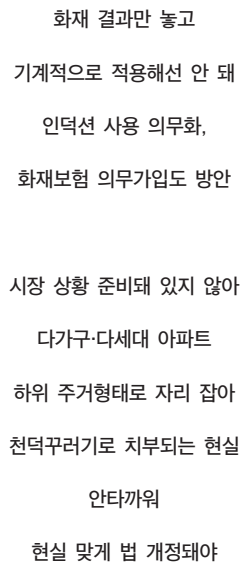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워져야지 결과가 이러니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윽박지르듯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또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시장은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주택에 적용할 만한 방화창은 이중창이나 프로젝트 창 정도가 다 이고 시스템창호는 전무한 형편이다. 단열, 결로 등에 신뢰할 만한 창호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너무 고가다.
간이스프링클러를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장비도 고가이고 소형 주택에서 설치 장소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다. 창의 개수를 줄이게 되면 환기나 채광에 문제가 생길 터이고, 방화창을 설치하자니 단열이나 결로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거주환경이 좀 안 좋아져도 어쩌다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확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니 좀 참고 살라고 강요하는 법이 아닐 수 없다.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고 도시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의 하위 주거형태로 인식된 지 오래다. 다가구, 다세대가 천덕꾸러기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적어도 이 법만큼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