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구청에서 주관하는 복합문화공간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사실 나는 사무소 개설 전 15년가량 PM(건설사업관리)을 20회 이상 수행한 바 있으며, 설계공모에도 참여해 다수의 당선·입상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사무소 개업 후 그간 설계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유는 다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2030년 AI가 심사를 하면 설계공모에 참가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 요즘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현행 설계공모가 그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이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협회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을 조정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자체·공기업 전관예우를 없애고 자질 없는 심사위원들의 배제, 전문성과 실무경력이 있는 건축사들 중에서 선발하는 조건이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여전히 심사 과정을 공개 않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금품을 수수한 수십 명의 심사위원 명단이 떠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더불어 어느 모 심사위원은 1년에 50개에 달하는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1년에 50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꼴인데 설계공모 심사하는 일이 부업이 아닌 오히려 본업이 아닐까.
설계경력 30년 이상인 나도 이번 심사에서 공모지침서와 질의회신 분석, 20여 개 작품 계획안을 검토하고 법규 및 지침 위반, 계획 특장점, 치명적인 단점 등 굵직한 문제만 검토했다. 그럼에도 A3 표로 2장 정리하는데 주말 간 꼬박 8시간, 월요일 오전을 통으로 매달려야 했다. 나름 일처리가 빠른 편이라 생각하는데, 작품 판단기준이 있음에도 이 정도 노력이 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심사를 한다면 심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세움터 내 ‘공공건축 설계공모’ 서비스에서는 해당 연도, 심사위원, 참여업체별 심사이력을 검색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설계공모 때 내가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1990년에 A+U 라는 책자를 통해 접한 에로 사리넨의 건축 정신 세 가지다. 첫째, 대지가 가지는 아이덴티티. 둘째, 사용자가 가지는 아이덴티티. 셋째, 시대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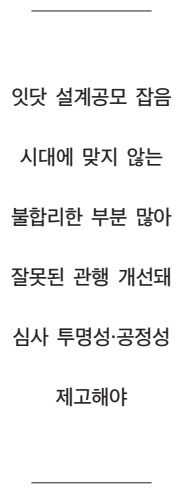
이번에 참여한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은 건축사 5명으로 구성됐다. 다수결에 의한 수차례의 선정과정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5개 입상안 중 1등에서 5등까지의 순위와 당선작은 패널 앞에 서서 토론하면서 정했다. 다행스럽게도 5명의 판단이 거의 일치했으며, 지면을 빌려 성심을 다해 심사를 해주신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근대 건축사 거장의 시대를 지난 후 현대건축은 팀이 이끄는 건축디자인 시대로 변모했다. 건축 교육, 출판, 컴퓨터프로그램, 재료, 신기술, 기획부터 설계·공사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발전이 건축설계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기술, 디지털 시대에 이뤄지는 작금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가 과연 시대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한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되어 가장 좋은 계획안, 작품이 선정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