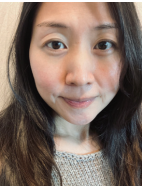
베두인들에게는 ‘낙타’를 지칭하는 낱말이 천 가지도 넘는다. 김소연 작가의 ‘마음사전’에 나오는 글귀다. 책을 읽다가 베두인이 뭔지 궁금해 찾아본다. 도시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로 하다르(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응되는 단어라고 한다. 낙타는 도시에서 동떨어진 그 곳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기에 지칭하는 말이 천 가지가 넘을까, 상상해본다.
설계를 시작하기 전 건축물이 놓일 장소만큼 내게 중요한 건 장소가 내뱉는 낱말들이다. 드러난 의미가 아닌, 감춰진 의미를 찾기 위해 파헤치고 들어가는 시간은 더디고 게으른 내가 몸과 마음에게 ‘이제 시작할 때야’라고 알려주는 루틴과 같다.
얼마 전 ‘봉안당’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이 루틴은 계획의 방향을 잡을 때 도움이 되었다. 보통의 공공건축물의 시작점이 장소성이라면 봉안당은 그 공간 속 사람들의 감정선에서 출발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 아픈 죽음의 경험이 없는 나는 이 감정선에 어떻게 다가가야할까. 다양한 매체를 둘러보며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타로카드에서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었다. 타로카드 13번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기사의 검은 갑옷과 쓰러진 황제가 죽음을 의미한다면 두 개의 탑 사이 태양과 어린아이는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성장을 뜻한다.
‘성장’이 고인과의 추억을 찾아오는 이들의 소풍이라면 이제 막 죽음을 마주한 첫 유족의 감정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연극 <빈센트 리버>는 소리내어 고통을 표현하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통해 부재하는 이의 존재를 감각한다고 말한다. 이 의미을 통해 첫 유족과 방문객의 동선을 분리시키는 안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특히 첫 유족 동선 상에 좁고 높은, 소리의 '울림'이 증폭될 수 있는 독립된 계단을 계획했다.
‘울림’이라는 낱말을 다시 파고든다. 소리가 부딪혀 되울림과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진 숲이라는 의미를 메모하고 다시 그 안의 ‘울’로 조금 더 들어가 본다.
두 개로 나뉜 감정선은 진입마당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중심 공간을 감싸 안는 두 개의 울이 되고 중심은 중정으로 자리 잡는다. 바람과 물, 빛과 소리로 가득한 삶의 에너지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위로하는 중정, 그 안에서의 울림이 삶에 대한 떨림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며 봉안당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언젠가는 나만의 어법을 정리한 마음사전을 만들고 싶다. 내 부족함으로 인해 도망치고 싶을 때, 아낌없는 응원으로 한걸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나만의 마음사전을 꿈꿔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