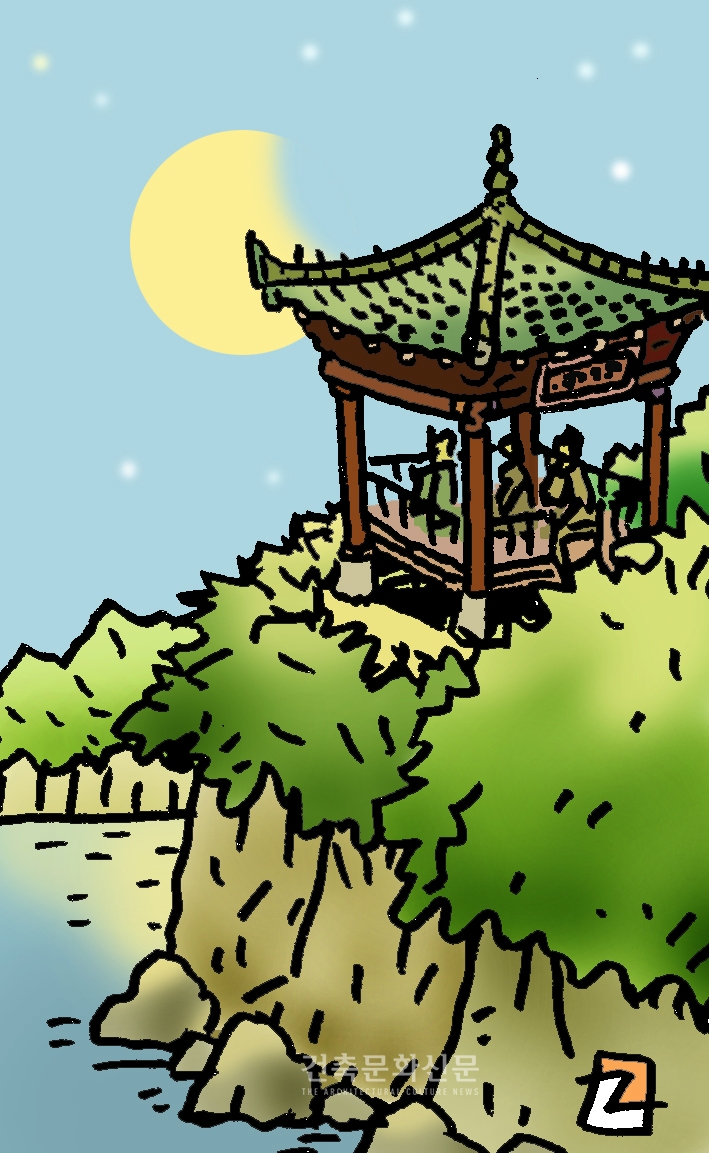
피서는 요산요수(樂山樂水),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민의 불변 1위는 동해안이다. 관동팔경은 동해의 보물이고, 빼어난 경승에 정자를 있어 그 운치를 더하고 있다. 정자는 ‘누(樓) 정(亭) 대(臺) 헌(軒)’ 등으로 불리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누가 공적 건물이라면 정은 사적공간일 확률이 높다. 삼척 죽서루, 강릉 경포대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 등 큰 규모의 정자는 모두 관정이다. 경승지가 없을 때는 네모꼴 못을 파 땅을 삼고 원형의 섬으로 하늘을 삼아 그 속에 정자를 두었으니, 남원 광한루와 그에 달린 영호정이 대표적이다. 못에 연을 심으면 연지(蓮池)가 되고, 그냥두면 달이 비친다 하여 ‘월지(月池)’라 불렀다. 경포대엔 여섯 개의 달이 있다. 하늘과 바다, 호수와 술잔에 각 하나씩 그리고 임의 눈동자에 비친 달이 둘이다. 뿐만 아니라 임의 가슴에 뜨는 보이지 않는 달(심월(心月)도 있다니 이쯤이면 신선이 따로 없다.
비원은 정자의 보고로서 사각 · 육각 · 팔각에 부채꼴의 평면, 2단 · 초가 등 형태나 재료의 다양함과 산과 물가, 반수반지(半水半地), 섬 등 적재적소의 위치와 그 크기가 절묘하다.
정자는 문이 없지만 문과 더불어 온돌까지 갖춘 것도 있고 지역별 특색도 많다. 경상도 안동지방에는 가문별로 종택의 정자들이 유명한데, 정자이름보다는 어느 댁 정자라야 찾기가 쉽다. 전라도 곡창지대에는 초가로 된 모정이 있어 공동의 쉼터로서 존재하고 있다. 종택의 정자는 관정만큼 화려한 것도 있지만 모정은 난간도 없이 소박하다. 하지만 인방을 서너치쯤 올려, 이를 베개 삼아 잠시 오수를 즐길거나 담배 한대 피우기 좋게 기능적으로 만들었다.
요즘 대단위 아파트엔 각양각색의 정자가 등장하고 있다. 전망이 좋은 경우는 드물지만 단지공원의 인공물가에 세우는 등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나 서향 쪽으로 활엽수를 심는 등 그늘을 만드는 점이 소홀하다. 여름철 그늘이 없다면 정자로서의 기능은 절멸이다.
고려조 천재 이규보는 그늘을 찾아 이동하는 사륜정기를 남겼다. 사방 여섯자 36평방척에서 기사(棋士) 둘과 거문고 뜯고, 시 짓고 노래하는 이 각 한명 그리고 주인까지 6명에 12평방척을 할애한 모듈건축의 선구자. 지붕재로 대나무를 써 이동의 편의성까지 고려하며 한 평 좁은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 그의 질박함과 주밀함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리워할 아름다운 고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마음이 고달플 때,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향이 하나있다. 그것은 창랑정이다.’ 유진오처럼 올 여름, 마음에 정자 하나쯤은 심어놓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