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 날씨가 수상하다 했더니 건축업계도 더위를 먹었는지 순살 xx, 통뼈 xx, 흐르지오 같은 얘기들이 나온다. 참 말도 잘 지어낸다. 재미있다기보다 웃고픈 일이다. 국토부의 전수조사, LH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이권 카르텔이다 뭐다 하고, 여기에 우리 협회와 구조기술사회 사이 분위기가 격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30년이 지나갔다. 건축사로서 처음 도면에 날인하던 때가 생각났다. 설레기도 했지만 겁도 나던 때, 내 위에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것 없었고, 힘들었어도 좌충우돌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왔던 것 같다. 작은 집을 설계해 주고 만 원짜리 꼬깃꼬깃한 팁을 받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드린 적도 있었다. 우연하게 대기업과 연계되어 설계를 맡게 되었을 때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이상 없다, 라고 했지만 현장에는 꼭 몇 가지씩 문제가 생기곤 했다.

작은 사무실에서 구조 체크에 도면 그리기, 수량 산출과 내역서 만들기 등을 해 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그런 나는 행운아였으나 한편으론 이런 건축기술들을 모두 섭렵하여 다방면의 기술자가 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선배 건축사들은 거의 모두가 만능 기술자였다. 학력이 높아서, 기회가 많아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현장에서 뒹굴고, 스스로 연필을 깎아가며 익힌 기술들이다. 손발이 일머리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절은 그대로 있질 않는다. 내 아는 형 한 분도 그랬다. 그는 광고업자였다. 손재주가 뛰어나 인근에서 알아주는 기술자였는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모두가 동일해져 버렸다고 한탄했다. 기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글자체에서부터 디자인까지 너무 획일화, 동일화하여 남은 것은 아이디어뿐이라고 아예 짐을 싸서 자카르타로 가 버렸고, 거기서 더욱 성장할 기회를 찾았다고 했다. 며칠 전 페북에 수채화 화가로 데뷔했다고 작품을 올려놓았다.
이렇듯 손에서 컴퓨터로 작업이 옮겨가는 동안 우리나라의 건축계, 건축사 인력 양성은 어떻게 되었었나를 생각해 본다. 불과 십수 년 전까지 건축공학과에서는 설계, 구조, 시공을 전문과목으로 편성하여 수강하게 했고, 그러고도 5년 경력을 가져야 고시를 치렀다. 기본을 거친 셈이다.
오구세대에서 연필세대로, 이젠 PC 세대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나 기술은 진보되었을 뿐, 기본은 그대로다. 바로 사람이다.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요즘의 건축교육은 건축학과와 건축공학으로 나뉘고 커리큘럼도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 같다.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하면서 건축학과는 실제 DIMENSION이나 DETAIL은 고사하고 그림 그리기(?) 우선으로 배우고 그것도 5년씩이나 교육이 이뤄지지만 시공이나 구조는 소홀한 형편이다. 다른 한편 건축공학에서는 설계는 수박 겉 핥기이고, 시공 구조 실무 등을 주로 익혀서 사회로 내보낸다고 한다. 실로 완전 양분화한 모습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직원들은 뽑아 일을 해보면 엉뚱한 그림들이 나와 깜짝 놀라기도 한다. 문짝, 화장실 한 칸, 철근 배근도면, 전기설비 매치…. 실무와 학과가 달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마저도 사람이 없다. 맨 아래·허리를 지탱해 줄 사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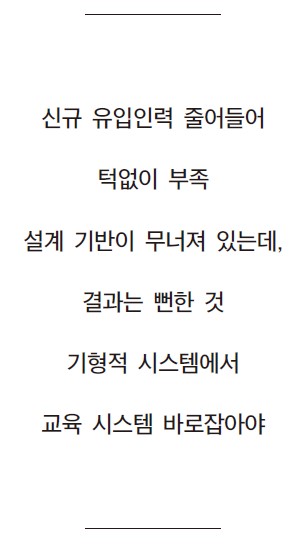
기술은 시스템에만 있지 않다. 사람과 사람의 머리와 손에 더 큰 비중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사, 기술사 누가 낙찰받고, 누구에게 도면을 그리라 했고, 누구에게 구조계산을 하게 한들 다 사람의 손을 거친 것이다. 이만 명에 도달한 건축사와 기천 명도 안 되는 구조기술사의 기형적 인력 구조를 보면 입찰제도 하나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이게 다인 듯하는 어떤 분의 인터뷰가 안타깝다. 입찰 분리와 구조감리제도를 운운하며 탓하기 전에 우리가 운용하는 사람들, 직원의 바탕이 튼실해야 함은 처음부터 당연한 사실 아닌가?
수주하여 검토하고 업무지시할 사람은 적고, 실무자도 많지 않은 인원이며 그나마 기본이 안된 수련자만 있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빈약한 교육의 결과인 실무자의 노고마저 없으면 사무소 자체가 운영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형적 시스템(하도에 재하도)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도면이 그려지고, 계산되며, 보강해야 할 곳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쳐다보고, 걱정하면 금번의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괜히 무량판 구조만 욕을 먹고, 캔틸레버 이해를 거꾸로 하는 현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처럼 들린다.
좋은 건축사보, 구조기술자 양성하는 구도의 건축교육은 지금의 교육제도에선 힘든 것 같다. 설계교육에 구조와 재료, 공법이 따로가 아닐 것이다. 건축공학 졸업자도 건축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무자 수련을 받았다면…. 포항지진 때 필로티 철근에 의지해 지탱하고 있던 건물이 생각난다. 그렇게라도 보강하여 건축되었기에 무너지지는 않지 않았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대피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욕은 많이 먹었으되 그들이 건축인들이다.

